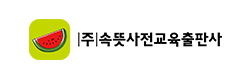2025. 5. 2(금) 한자와 명언 嗚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뜻사전관련링크
본문
2025. 5. 2(금)
한자와 명언(2115)
嗚 呼
*한숨소리 오(口-13, 3급)
*부를 호(口-8, 5급)
한문 문장에서 ‘주로 슬프거나 탄식할 때 내는 감탄사’로
애용되는 ‘嗚呼’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자. 아울러 ‘탄식’과 관련된 명언이나 명구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嗚자는 입으로 내는 ‘탄식 소리’(sigh sound)를 뜻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입 구’(口)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烏(까마귀 오)는 발음요소이니 뜻과는 무관하다. 탄식, 즉 한숨은 주로 슬플 때 내기 때문에 ‘슬플 오’라는 훈을 지니게 됐다.
呼자는 입 밖으로 내 쉬는 숨, 즉 ‘날숨’(expiration)을 뜻하기 위한 것이니
‘입 구’(口)가 의미요소로 쓰였고, 乎(호)는 발음요소일 따름이다. 후에 ‘부르다’(call) ‘부르짖다’(clamor)는 뜻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嗚呼는 ‘슬플 때나 탄식할 때[嗚] 내는 소리[呼]’를 이른다.
당나라 때 한 시인은 ‘소를 탄식하며’(嘆牛)란 제목의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다 바치고 나면 몸값이 떨어지고,
공을 다 이루고 나면 목숨을 잃게된다.”
用盡身賤, 용진신천
功成禍歸. 공성화귀
- 劉禹錫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우석의 시 <탄우>(嘆牛)는 힘든 농사일을 묵묵히 해내는 소의 모습에서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의 헌신적인 노동’, ‘보잘것없는 대우’, ‘공을 이루고도 화를 당함’,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탄우>는 힘없는 존재가 헌신적으로 일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인 “用盡身賤, 功成禍歸”는 이러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당나라의 저명한 시인이자 관료, 문장가인 유우석은 772년에 태어나 84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그의 시는 호방하고 때로는 풍자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백거이(白居易)는 유우석을 ‘시호’(詩豪)라고 칭송했으며, 유종원(柳宗元)과 함께 ‘유유’(劉柳)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누실명>(陋室銘), <오의항>(烏衣巷), <죽지사>(竹枝詞) 등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시는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참고, GEMINI).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